--연구원 칼럼(舊)
한시의 고향을 찾아서 5. 유장경의 시
원정근 연구위원
한시의 고향을 찾아서 5
유장경劉長卿의 「눈을 만나 부용산의 주인집에 머물며(봉설숙부용산주인逢雪宿芙蓉山主人)」
【제목풀이】
이 시의 제목은 「봉설숙부용산주인逢雪宿芙蓉山主人)」이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부용산의 주인집에 하룻밤 머물면서 그 감회를 적은 시다. 여기서 부용산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유장경劉長卿(709?-790?)은 자는 문방文房이고, 하간河間(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하간현河間縣) 사람이다. 당나라 현종玄宗 천보天寶(742-756) 연간에 진사로 급제하였다. 강직한 성품에 두 차례나 벼슬살이에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였다. 당나라 덕종德宗 건중建中(780-783) 연간에 수주자사隨州刺史를 끝으로 벼슬살이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장경을 유수주劉隨州라고 불렀다. 유장경은 오언시에 아주 뛰어나 ‘오언장성五言長成’이라 불리기도 한다.
해 저무니 푸른 산 더욱 멀고,
날 차가운데 가난한 띳집.
사립문에 개 짖는 소리 들리고,
눈보라 치는 밤 돌아오는 이.
일모창산원日暮蒼山遠,
천한백옥빈天寒白屋貧.
시문문견폐柴門聞犬吠,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
앞의 두 구절에서 첫째 구절은 산길을 가다가 느낀 것을 적은 것이고, 둘째 구절은 길손이 민박집에 투숙하여 본 것을 적은 것이며, 셋째 구절과 넷째 구절은 길손이 민박집에 투숙하여 들은 것을 적은 것이다. 앞의 두 구절은 짙푸르게 보이는 먼 산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민박집의 시각 이미지를 살린 것이고, 뒤의 두 구절은 민박집에서 멍멍 짖어대는 개의 청각 이미지를 살린 것이다. 어느 비평가가 말한 것처럼, 이 시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정감이 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이다. 길손은 산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었다. 날은 저물어 어두운데 갈 길은 아득히 멀다. 황혼의 어스레한 빛에 어둑어둑한 산은 아스라이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 시인은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렸다. 어서 빨리 하룻밤 잠잘 곳을 찾아 쉬고자 하는 길손의 다급한 심정을 ‘원遠’이라는 글자로 절묘하게 표현하였다. 길손은 마침내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아 들어갔다. 눈 덮인 하얀 초가집이다. 하지만 날씨도 을씨년스럽거니와 민박집조차도 누추하기 그지없다. 썰렁한 추운 날씨와 초라한 민박집의 애옥살림의 관계가 교묘하게 하나로 어우러진다.
시인은 온종일 피곤한 여정에 지쳤다. 민박집에 들어가 저녁 밥상을 물리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깊이 잠에 빠져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른다. 한밤중 갑자기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산 아래의 마을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부용산의 주인을 개가 누구보다 앞서 반갑다고 소리친다. 이윽고 펑펑 쏟아지는 눈을 함뿍 맞은 부용산의 주인은 사립문 앞에서 함박눈을 툴툴 털면서 아내에게 사립문을 빨리 열라고 재촉한다. 부용산 주인의 아내가 서둘러 문 밖으로 뛰어나가 사립문을 열고 돌아오는 바깥주인을 반갑게 맞이한다.
시인은 객지를 정처 없이 떠도는 길손의 입장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귀인歸人)’를 통해 식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고픈 절절한 바람을 표출하였다.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날이 저물면 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꾼다. 그런데 이 시를 쓸 당시에 유장경은 좌천되어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언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딱한 처지였다. 그러니 유장경의 입장에서야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부용산의 주인이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숙종과 영조 때, 최북崔北(1712-1786?)이라는 걸출한 화가가 있었다. 그는 유장경의 「봉설숙부용산주인逢雪宿芙蓉山主人)」을 바탕으로 ‘풍설야귀도風雪夜歸圖’라는 그림을 그렸다. ‘풍설야귀도’는 눈보라 치는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다.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손에 먹을 묻혀 그린 그림이다. 지두화指頭畵다. 최북은 유장경의 시와는 달리 사립문 밖까지 달려 나온 개가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짖는 것이 아니라, 문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동자를 경계하면서 맹렬하게 짖어대는 모습을 그렸다. 왜 최북은 나그네와 동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을까? 최북은 혹시 북풍한설이 휘몰아치는 밤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자신의 불우한 상황과 처지를 그려 인생의 고달픔과 외로움을 노래한 것은 아닐까? 최북은 한평생 고달픈 인생길에 허덕이다가 어느 추운 겨울밤에 동대문 밖 성 밑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얼어서 죽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시라도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새해 되니 고향생각 간절하여,
하늘가에서 홀로 눈물짓네.
늙도록 남의 밑에 있건만,
봄이 돌아와 내 앞에 있구나.
고갯마루 잔나비와 하루를 같이 하고,
강가의 버들과 풍경을 함께 하네.
내 신세 이미 장사부 같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또 몇 년을 보내야 할꼬?
향심신세절鄕心新歲切,
천반독산연天畔獨潸然.
노지거인하老至居人下,
춘귀재객선春歸在客先.
영원동단모嶺猿同旦暮,
강류공풍연江柳共風煙.
이사장사부已似長沙傅,
종금우기년從今又幾年?
이 시의 제목은 「새해에 짓노라(신년작新年作)」이다. 시인이 남파南巴 현위로 좌천되었을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정치적 실의와 울분에 휩싸여 지은 시다. 남파는 지금의 광동성廣東省 무명현無名縣이다. 시인은 고향을 떠나 하늘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해가 바뀌는 때에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향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간절한 법이다. 남들은 모두 새해가 왔다고 기뻐하건만, 시인은 객지에서 새해를 보내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절로 나오고, 눈물이 절로 흐른다. 오랫동안 벼슬살이를 하느라 남 밑에서 마음이 육신의 부림을 당하였다.
봄은 어느새 다시 돌아왔건만, 길손은 자신의 집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돌아가지 못하는 시인과 돌아온 봄을 대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슬픔을 절묘하게 표현하였다. 날마다 그저 자연의 풍경과 벗을 삼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시인은 자신의 신세를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를 지냈던 가의賈誼(BC 200-BC 168)에 비기고 있다. 가의는 한漢 문제文帝의 총애를 받았으나 대신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장사왕 태부로 좌천을 당하였다. 시인도 가의와 같이 중앙 정계에서 쫓겨났다. 그러니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자신의 평생의 뜻을 알아주는 지기야말로 진정한 삶의 고향 동무가 아니겠는가?"
나뭇잎 지고 해질녘 하늘 아득한데,
푸른 단풍은 서리에 잎이 성글었네.
강물과 마주한 외딴 성은 닫혀있고,
외론 새는 사람을 등지고 날아가네.
나루에 달은 막 떠오르는데,
이웃집 어부는 아직 돌아오지 않네.
고향생각에 참으로 애간장 끊어질 듯,
어디선가 겨울옷 다듬질 소리.
요락모천형搖落暮天逈,
청풍상엽희靑楓霜葉稀.
고성향수폐孤城向水閉,
독조배인비獨鳥背人飛.
도구월초상渡口月初上,
인가어미귀隣家漁未歸.
향심정욕절鄕心正欲絶,
하처도한의何處搗寒衣?
이 시의 제목은 「여간의 여관(여간여사餘干旅舍)」이다. ‘여간’은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여간현餘干縣이다. 이 시는 시인이 당나라 숙종肅宗 상원上元 이년二年(761)에 폄적되었던 남파에서 북쪽으로 돌아갈 때 여간의 여관에 머물면서 그 느낀 바를 적은 것이다.
소슬한 가을빛은 완연하다. 바람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푸른 단풍은 서릿발을 맞아 붉게 물들었다. 강물을 마주한 쓸쓸한 여간의 성문은 꽉 닫혀 있고, 외로운 새는 사람을 등지고 날아간다. 쓸쓸한 여간의 성과 고독한 새를 통해 외로운 시인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시인의 고독감을 ‘고孤’와 ‘독獨’으로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다.
나룻터에 초저녁 달이 막 솟아오르는데도, 이웃집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웃집 어부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절절한 자신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지금쯤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 달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어느 집에서 아낙네의 겨울옷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온다. 오늘따라 고향집에서 자신이 돌아오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아내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 애간장이 다 탈 지경이다.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에게 고향은 언제나 그리움이요 눈물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딩가딩가 칠현금 소리,
조용히 들으니 솔바람 차갑구나.
옛 곡조 절로 사랑스럽건만,
지금 사람 대부분 타지 않누나.
영령칠현상泠泠七絃上,
정청소풍한靜聽松風寒.
고조수자애古調雖自愛,
금인다불탄今人多不彈.
이 시의 제목은 「금 타는 소리를 들으며(청탄금聽彈琴)」이다. 이 시는 금을 통해 자신의 참뜻을 알아주는 지음을 만나기 어려움을 하소연한 것이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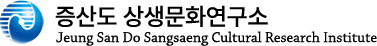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







